허용응력과 허용하중 (ALLOWABLE STRESSES AND ALLOWABLE LOADS)
공학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하중을 지지하고 전달하도록 설계된 물체의 용량이다. 하중을 견디는 물체는 건물구조, 기계, 항공기, 차량, 선박 및 그 밖에 인류가 만든 수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단순화하여 이러한 모든 물체들은 구조물(structures)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물이란 하중을 지지하고 전달해야 하는 어떤 물체를 말한다.
구조적 파손을 피하려고 한다면 구조물이 실제로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이 작동 중 요구되는 하중보다 커야만 한다. 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능력을 강도(strength)라 부른다면, 앞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다시 말할 수 있다: 구조물의 실제 강도는 요구되는 강도를 초과해야만 한다. 요구강도에 대한 실제강도의 비(比)를 안전율(factor of safety) \(n\)이라 부른다.
\[n=\frac{\rm 실제강도}{\rm 요구강도}\]
물론, 파손을 피해야 한다면 안전율은 1.0 보다 커야만 한다. 환경에 따라 안전율은 1.0 보다 약간 큰 값부터 10 정도까지 사용된다.
강도와 파손 모두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설계에 안전율을 포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파손(failure)이란 구조물의 파단이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거나, 변형이 어떤 한계를 초과하여 구조물이 더 이상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후자의 파손 종류는 실제 붕괴의 원인이 되는 하중보다 휠씬 적은 하중에도 발생할 수 있다. 안전율의 결정은 또한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야 한다: 구조물의 돌발적인 과부하 확률; 하중의 종류(정하중, 동하중 또는 반복하중)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는지; 피로파괴의 가능성; 건설 시 부정확성; 기술의 정도; 재료 물성 산포; 부식이나 환경 영향에 의한 악화; 분석방법의 정확성; 점진적 (충분한 경고) 또는 점진적 (경고 없음) 파손인자; 파손의 결과(미소한 손상 또는 대형 참사); 그리고 이러한 다른 고려 사항들리 있다. 안전율이 너무 낮다면 파손 가능성이 높아 구조물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안전율이 너무 크면 구조물은 재료의 낭비가 심하고 기능 대비 부적합할 것이다(예를 들면 과중량일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안전율을 수립할 때는 타당한 공학적 판단이 요구된다. 안전율은 보통 다른 설계자들이 사용하는 규정과 사양을 만드는 경험 있는 공학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적인 예로 안전율을 정의하고 개발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많은 구조물에서 하중 제거 후 영구변형을 피하기 위해 재료가 선형탄성 범위에 남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설계의 공통적인 방법은 구조물의 항복에 대한 안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조물 내의 어떤 지점이 항복응력에 도달할 때 그 구조물은 항복을 시작한다. 항복응력에 대해 안전율을 적용함으로써 구조물 내의 어떤 지점에서도 초과하면 안되는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또는 사용응력(working stress)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sigma_{\rm allow}=\frac{\sigma_{\rm y}}{n}\]
여기서 허용응력과 항복응력을 각각 \(\sigma_{\rm allow}\)와 \(\sigma_{\rm y}\)로 표기하였다. 건물설계에서는 항복에 대한 통상적인 안전율 \(n\)은 1.67 이다; 따라서 36 ksi의 항복응력 \(\sigma_{\rm y}\)을 갖는 연강은 21.6 ksi의 인장 허용응력 \(\sigma_{\rm allow}\)를 갖는다.
또 다른 설계방법은 항복응력 대신 극한응력(ultimate stress)에 안전율을 적용하여 허용응력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콘크리트 같은 취성재료에 적합하고, 또한 목재에도 사용된다. 이 허용응력은 식
\[\sigma_{\rm allow}=\frac{\sigma_{\rm u}}{n}\]
로부터 얻어지고, 여기서 \(\sigma_{\rm u}\)는 극한응력이다. 보통 극한응력에 대한 안전율은 항복응력에 대한 것보다 휠씬 크다. 연강의 경우, 항복에 대한 안전율 1.67은 극한응력에 대해서는 약 2.8배에 해당한다.
기술할 마지막 방법은 응력이 아니라 하중에 안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를 유발하는 하중의 의미로 극한하중(ultimate loads)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구조물이 사용 중 지지해야 되는 하중을 사용하중(service loads) 또는 작동하중(working loads)이라 부른다. 안전율은 후자에 대한 전자의 비이다.
\[n=\frac{\rm 극한하중}{\rm 사용하중}\]
사용하중은 아는 값이므로, 통상 설계절차는 극한하중을 얻기위해 사용하중에 안전율을 곱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조물은 바로 극한하중에서 파손되도록 설계된다. 이 설계방법은 강도설계(strength design), 또는 극한하중설계(ultimate-load design)로 알려져 있고, 안전율은 사용하중의 승수이므로 부하율(load factor)이라고 한다.
\[\rm 극한하중=(사용하중)(부하율)\]
강화 콘크리트 구조설계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부하율은 구조물 자체 무게인 자중(dead load)에 대해서 1.4, 구조물에 가해지는 동하중(live loads)에 대해서는 1.7 이다. 강도설계 방법은 통상적으로 강화 콘크리트 구조나 경우에 따라 강 구조에도 사용되다.
항공기 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안전률보다 안전한도를 말한다. 안전한도(margin of safety)는 안전율에서 일을 차감해서 정의한다.
\[{\rm 안전한도}=n-1\]
따라서, 요구강도의 두 배인 극한강도를 가진 구조물은 안전율이 2.0 이고 안전한도는 1.0 이다. 안전한도가 영으로 감소하거나 더 작아지면, 그 구조물은 (아마도) 파손될 것이다.
[예제 1] 짧은 중공, 주철 원통(그림 1)이 축압축 하중 \(P=120\ \rm kips\)를 지지하고 있다. 재료의 압축 극한응력은 \(\sigma_{\rm u}=35,000\ \rm psi\) 이다.
 |
| 그림 1 예제 1 |
<풀이> 허용 압축응력은 극한응력을 안전율로 나눈 것과 같다.
\[\sigma_{allow}=\frac{\sigma_{\rm u}}{n}=\frac{35,000 \rm psi}{3}=11,670\ {\rm psi}\]
요구되는 단면적을 이제 구할 수 있다.
\[A=\frac{\pi d^2}{4}-\frac{\pi(d-2t)^2}{4}=\pi t(d-t)\]
여기서 \(d\)는 외경이고 \(d-2t\)는 내경이다. \(d\)에 대해서 풀고 \(t=1\ \rm in.\)와 \(A=11.4\ \rm in.^2\)을 대입하면,
\[d=t+{A\over\pi t}=1\ {\rm in.}+{11.4\ \rm in.^2\over\pi(1\ \rm in.)}=4.55\ \rm in.\]
를 얻는다. 외경은 요구 안전율을 가지기 위해 최소 이 정도 크기는 되어야 한다.
[예제 2] 사각단면 강봉(10×40 mm)이 인장하중을 받고 직경 15mm의 원형 핀으로 지지부에 고정되어 있다. 봉의 인장과 핀의 전단 허용응력은 각각 \(\sigma_{\rm allow}=120\ \rm MPa\)과 \(\tau_{\rm allow}=60\ \rm MPa\) 이다. 하중 \(P\)의 최대 허용값은 얼마인가?
 |
| 그림 2 예제 2 |
<풀이> 사각봉의 인장응력은 핀의 구명을 포함한 단면의 순면적(net area)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봉의 안장에 따른 허용하중 \(P_1\)은
\[P=\sigma_{\rm allow}A_{\rm net}=(120\ \rm MPa)(250\ mm^2)(40\ mm-15\ mm)(10\ mm)=30\ kN\]
이다. 이 계산은 구명에 의한 어떠한 국부응력도 무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핀의 전단에 의한 허용하중을 계산한다. 이 판은 두 개의 단면이 전단하려고 하므로 작용하는 전체하중은
\[P_2=\tau_{\rm allow}(2A)=(60\ \rm MPa)(2)\left({\pi\over4}\right)(15\ mm)^2=21.2\ kN\]
이다. 여기서 \(A\)는 핀의 단면적이다. 두 개의 \(P\)값을 비교하면 핀의 전단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고 하중의 최대 허용값은
\[P_{\rm allow}=P_2=21.2\ \rm kN\]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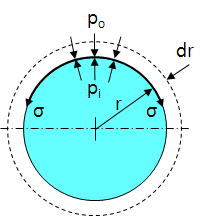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